 |
Contact Us |
|
Contact 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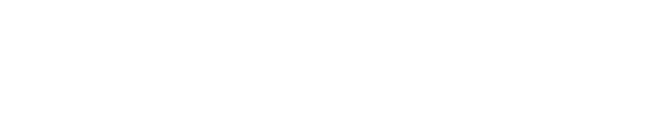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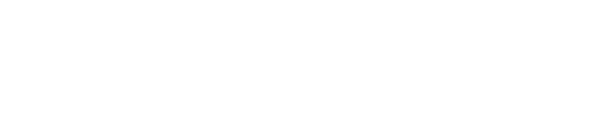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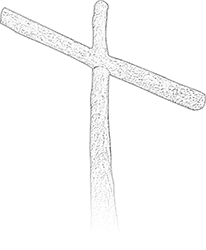
잠실희년교회
희년(禧年·The Jubilee)은 50년만에 잃었던 땅을 되찾고 노예가 풀려나는 은혜의 해입니다(레위기 25장).안식·해방·복권의 희년은 시공을 뛰어넘어 요청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 희년 칼럼잠실희년교회에 오신걸 환경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
18.3% 대 0.4%.
한국(2005년)과 일본(2002년)의 개신교인 비율이다. 선교 역사가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에 개신교세가 이처럼 빈약하다는 것은 참 의아한 대목이다.
조선에서 신교(信敎)의 자유는 1886년 조·불(朝佛) 수호조약 때 처음 인정됐지만 한국 교회는 1884년을 개신교 포교의 시작으로 본다. 반면 일본은 1858년 미·일 화친조약에서 포교의 자유가 보장됐다.
당시 선교의 주축은 서양 선교사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의 증조부 제임스 커티스 헵번을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약했다.
한국에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대동강변에서 참형을 당하면서도 한문 성경을 처음 전해주고 순교했던 로버트 토머스 목사를 비롯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이 선교 열정을 불태웠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로버트 하디 목사가 중심이 된 1903년 원산의 참회기도회가 출발점이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서구 교회·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 일본에선 기독교가 재래 종교인 신도(神道)의 벽에 막혀 확산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 교계의 해외선교 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173개국에 1만6616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있다. 세계 2위의 규모다. 그 외 비공식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3명의 한국 크리스천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리를 지어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 교계의 해외선교 확산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다. 피랍자들이 섬기고 있는 분당샘물교회는 이들의 행보를 선교가 아닌 봉사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두고 크리스천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그들의 무사귀환이 절실한 지금 논란을 거론하는 건 사족에 가깝다. 그보다 구약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곱씹어보는 편이 더 낫겠다.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적국인 앗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됐다고 외치라는 것이었다.
요나는 반발했다. 조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신념에서 그는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도피행은 실패하고 그는 결국 니느웨에 이끌려가서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시작했다.
마침내 심판은 거둬들여졌고, 그 꼴을 본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며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집 센 요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니느웨엔 어린애들이 12만명이나 되는데…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요나 4:11)
선교 명령을 받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배타적 민족주의로 가득 찬 요나에게 니느웨의 어린 목숨 따위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의 해외선교가 니느웨로 떠나라는 지상명령을 떠받들고 가는 길이라면 중요한 것은 명령 그 자체가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관심이다.
해외선교·봉사 그 자체보다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상대에 대해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니느웨로 가는 길은 파송 명령을 받드는 자나 그를 지켜보는 자, 니느웨의 백성들까지 이들 모두의 평안이 최종 목표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평안하지 않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참 어렵다.
2007년 7월 24일 조용래 논설위원